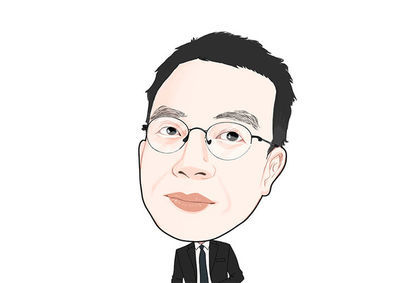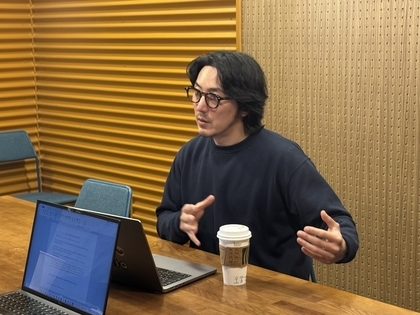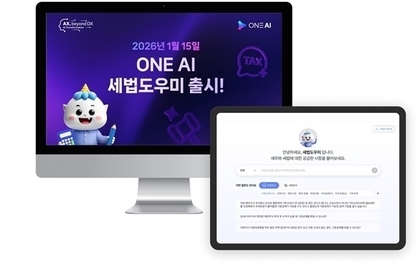[딜사이트 강울 기자] '서민'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자주 호출되는 단어다. 서민주택, 서민밥상, 서민물가. 이름만 보면 모두 서민을 위한 제도 같지만, 정작 서민이 누리는 건 없다. 요새는 '서민'이 붙을수록 서민과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펼쳐진다.
상호금융의 시작은 '서민을 위한 금융'이었다. 농촌과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금이 돌지 않던 시절,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이 그 뿌리다.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저축과 대출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며 소득이 낮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말 그대로 '서민이 세운 서민금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서민을 위한 금융이 이제는 서민을 지탱하던 금융에서 위험에 처한 금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상호금융 전체의 연체율은 5.7%다. 이 수치는 단순히 부실의 증가를 뜻하지 않는다. 한때 지역 서민의 자금줄이자 안전망이었던 상호금융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각각 8.36%, 8.37%로 치솟으면서 서민을 지탱하던 금융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도 부실 심화를 뒷받침한다. 상반기 기준 새마을금고가 8.68%로 가장 높고, 농협 5.38%, 수협 8.26%, 신협 8.53%이 뒤를 잇는다. NPL비율이 높다는 건 상호금융의 위험이 잠재적 우려를 넘어 현실적 리스크로 전이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서민 대상 가계대출보다 부동산PF 등 기업대출을 확대해온 결과다. 예컨대, 새마을금고는 2022년 말 기업대출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였으나 올해 상반기 57%로 늘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런 흐름은 상호금융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본래 '생활자금, 서민금융'을 지원해야 할 기관들이 보다 수익성이 높은 기업대출·부동산 PF로 빠르게 이동한 결과, 대출 포트폴리오가 서민 가계대출 중심에서 기업·부동산 위주로 재편됐다. 그만큼 고위험 채권 노출이 커지고,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각종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주어만 바뀔 뿐, 본질은 같다. 어느 날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금을 빼돌리고, 또 어느 날은 신협에서 불법 대출과 횡령이 터진다. 2019년 이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만 약 400억원에 달한다. 상호금융이라는 이름 아래 지역사회 신뢰로 유지돼온 조직이지만, 내부통제의 허술함 앞에서는 어느 곳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상호금융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서민의 금융을 자처하면서도 수익성에 몰두한다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것이다. 지역과 조합원의 돈으로 성장한 만큼 그 책임 또한 지역과 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연체율과 사고율이 보여주는 경고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서민의 신뢰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다. 상호금융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되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