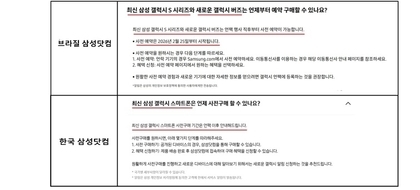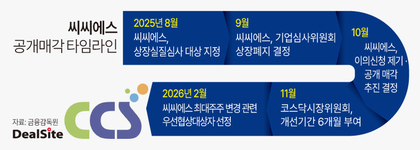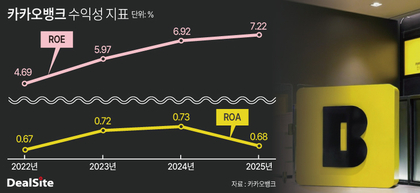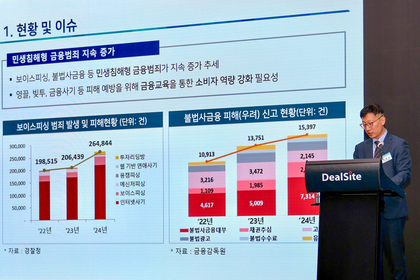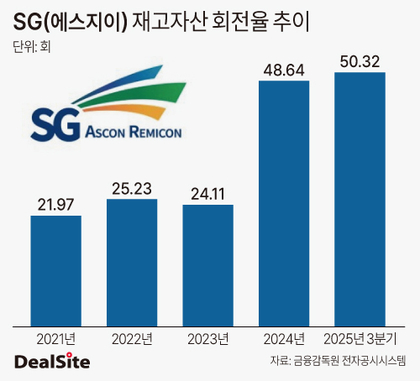수협은행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추진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경영진 교체 이후 전략의 방점이 '건전성 제고'로 이동한 데다, 비은행 계열사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여건도 녹록지 않아서다. 여기에 금융지주 설립의 전제 조건인 수협법 개정 논의마저 본격화되지 않으면서 지주사 전환은 장기 과제로 밀린 모습이다. 딜사이트는 수협은행의 지주사 구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과 현재 좌표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수협은행이 추진해 온 지주사 전환 작업이 사실상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전임 경영진이 미래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웠던 역점 과제였지만, 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신학기 수협은행장 체제에서는 내부 건전성 제고와 자본 여력 확충이 선결 과제로 부상하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분위기다. 여기에 적합한 인수합병(M&A) 매물이 제한적인 데다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과 내부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제까지 겹치면서 지주사 전환은 당분간 장기 검토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최근 3년간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해왔지만, 가시적 성과는 자산운용업 진출에 그쳤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9월 트리니티자산운용을 인수해 수협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는 지주사 전환을 위한 교두보 성격이라기보다는 비이자이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선택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2022년 말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계기로 미래 비전을 선포하며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려면 2개 이상 금융업권의 회사를 지배해야 한다. 당시 수협중앙회 산하에는 수협은행만 있었던 만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수협은행 산하에 최소 한 곳 이상의 비은행 금융회사를 추가로 편입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에 수협은행은 웰컴캐피탈 등 여러 비은행 매물을 검토했다. 하지만 체급에 비해 매각가가 높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실제로 수협자산운용 인수 대금은 약 200억원 수준으로, 대형 금융그룹들이 추진하는 수천억원대 거래와는 거리가 있었다. 결국 확장 전략은 '의지'보다는 '현실'에 의해 제약을 받아온 셈이다.
노 회장은 공식석상에서 "지주사 전환 검토는 이어가고 있지만 제반 여건을 고려해 현재는 보류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신 행장 역시 자산운용사 인수 당시 금융투자 사업 확대와 이익구조 개선을 강조했을 뿐, 지주사 전환에 대한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 확장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조합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경영진 교체 역시 전략의 무게중심 이동에 영향을 미쳤다. 임준택 전 회장과 강신숙 전 행장 체제에서 비교적 공격적으로 추진되던 지주사 구상은 현 체제 들어 자본 적정성 확보와 내부 체력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조로 조정됐다.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 내실 다지기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아울러 수협 조직의 특수성도 변수다. 수협은 개별 협동조합이 모인 구조로, 조합원 자금이 기반이 되는 특성상 대규모 자본 재배치나 공격적 M&A에 대한 내부 설득 과정이 필수적이다. 지주사 전환이 수익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존재하지만 조합의 안정성과 공공적 성격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현행 수협법에는 금융지주사 설립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주무부처 및 국회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전략·자본·입법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맞물려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작업은 오랜 기간에 걸친 비은행 계열사 M&A와 건전성 제고가 동시에 수반돼야 하는 데다가 수협법 개정도 불가피하다는 등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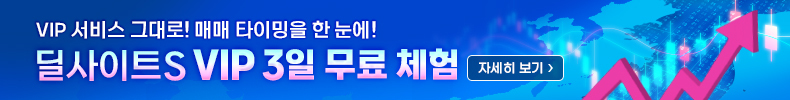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