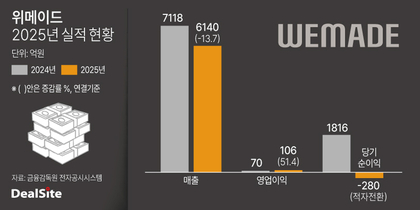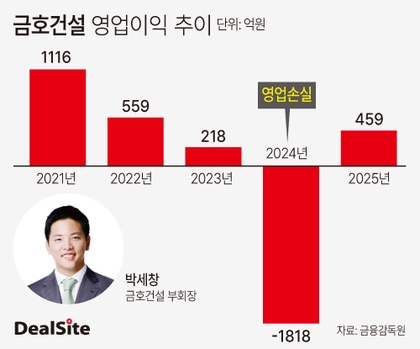[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1조4000억원 규모의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수주전에서 한화시스템과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제조 원가'와 '양산 효율'을 주제로 격돌하고 있다. 단 한 기의 성능에 집중하던 중대형 위성 시대와 달리, 수십기의 위성을 제작하는 '군집 위성' 체계가 도입되면서 양산 거버넌스를 통한 단가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과거 5대 제작에 그쳤던 '425사업'이 기술의 '존재 증명'이었다면, 이번 초소형 군집 위성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우주 산업이 '자생적 생태계'를 갖출 수 있는 산업인지를 묻는 첫 번째 시험대다.
한화시스템은 제주 우주센터를 거점으로 '설계-제조-발사'를 잇는 물류 최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내륙에서 제작해 이동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조와 발사 간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위성 밸류체인 전반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내륙 공장에서 제작된 위성은 진동과 충격에 극도로 예민한 정밀 부품이다. 특수 진동 방지 차량에 실려 수백 km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비용, 시간(리드타임), 미세한 충격 등은 위성 품질 관리에 있어 변수였다.
제주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최적의 발사 각도 확보가 가능하며, 내륙 운송 과정 없이 제조 공장에서 발사장(해상 혹은 인근)으로 연결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기존 중대형 SAR 위성이 단 한 기에 모든 성능을 집약한 '주문제작형 예술품'이었다면, 초소형 SAR 위성은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극도의 경량화와 양산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우주센터는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해 최적의 발사 각도와 안정된 낙하 구역 확보가 가능하다"며 "위성 개발부터 제조, 발사, 관제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한 곳에서 수행하며 보다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화는 기술 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 마진 내재화 역시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탑재체와 본체를 동시에 개발해 인터페이스 업무를 최적화하고, 외부 협력사에 지불하던 마진을 줄여 단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 측은 위성 제작과 시험 절차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간 100기 양산 능력을 확보했으며, 이는 향후 저궤도 통신 위성 등 민간 위성 수주 시에도 동일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KAI는 수백 대의 완제기를 생산하며 축적한 '규모의 경제'와 항공기 양산 공정 노하우를 전면에 내세웠다. 4t급 대형 열진공 챔버를 통해 위성 8기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제작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이다. KAI는 중대형 위성 위주의 개발에서 초소형 위성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공용화된 플랫폼 구조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초소형 SAR 위성은 과거 1~2기 제작에 그쳤던 중대형 위성과 달리, 2~3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최초의 양산 개념'이 도입된 사업"이라며 "KAI는 이미 2020년에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의 고난도 위성 사업을 총괄해온 만큼 양산성과 신뢰도 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공기 라인 생산 노하우와 시험 자동화 설비를 위성 공정에 그대로 이식했다"며 "스마트폰처럼 규격화된 제품을 균일한 품질로 쏟아내는 '스마트 팩토리'형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제조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구독형 서비스'를 결합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FA-50 등 국산 항공기 수출 네트워크에 위성 영상 분석 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 제공함으로써 초기 도입 비용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위성을 한 번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고객을 자사 생태계에 묶어두는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이 설계부터 운용까지 책임지는 '체계종합'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산 실패의 책임은 고스란히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단가 조절에 실패해 '한국산 위성은 비싸다'는 낙인이 찍히면, 향후 글로벌 저궤도 통신 시장 입찰에서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기 힘든 '고비용 구조'에 갇힐 수 있다.
결국 양산화 사업이 지연되거나 단가 조절에 실패할 경우, 국내 우주 기업들은 수천억원의 매몰 비용을 떠안은 채 스타링크 등 글로벌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으로 진입할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K-방산의 다음 타자인 'K-우주'의 수출 경쟁력이 뿌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위성은 2~3년마다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소모품적' 성격이 강해, 한 번 양산 시스템 구축에 실패하면 후속 수주전에서도 도미노식 패배가 예상된다"며 "단순히 고성능 위성을 만드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차 없이 똑같은 품질로 찍어내느냐는 거버넌스 싸움에서 승리한 쪽이 향후 민간 위성 시장의 주도권까지 거머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