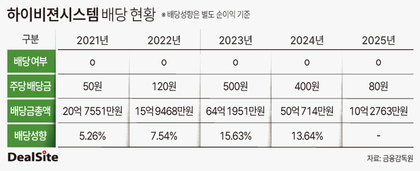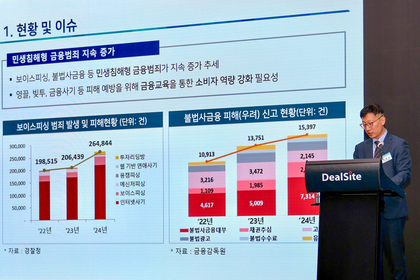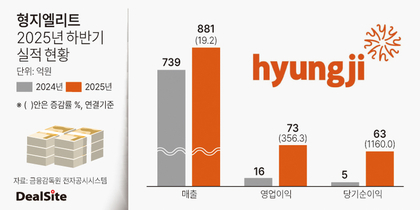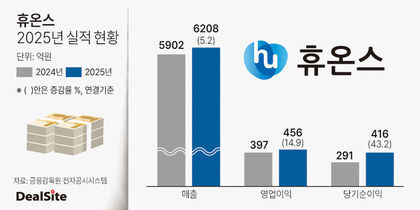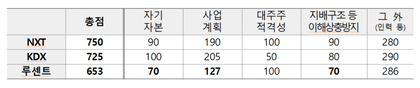[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최근 한국거래소의 기업공개(IPO) 심사가 유례없이 보수적인 기조로 흘러가고 있다. IPO 업계에서 수십 년 몸담아온 '터줏대감'급 인사들조차 "이 정도로 심사 분위기가 경직된 건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다. 상장 예비심사를 철회하거나 심사 미승인을 통보받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에서 그 기조가 두드러진다. 사실상 "상장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수준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기술성평가 기관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에는 가능한 한 적정 등급을 부여하지 말라고 하거나, 의료기기 업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등급을 주라는 식으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기대를 걸었던 혁신기업들은 길이 막혔다. 벤처캐피탈과 창업 생태계 전반도 마찬가지다. 많은 초기투자자들이 IPO를 '회수전략'으로 보고 있지만, 상장이 어려워지면서 세컨더리 시장마저 작동하기 힘들어졌다. 결국 유망 기업도 적기에 투자를 받지 못하면서 성장을 멈추거나, 도산하는 경우도 생겼다.
'위험은 시장이 판단한다'는 미국식 철학을 우리 자본시장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다. 한국은 투자자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삼는 환경이고, 그 점은 분명 존중해야 한다. 상장 문턱이 일정 수준 높게 유지되는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까지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땐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며 수많은 기업들을 상장시켰다. 그 결과 '뻥튀기' 실적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와 같은 후유증을 남겼고 이후 거래소는 기업 상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기복이 큰 정책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다.
탄핵 이후 새로운 정부를 맞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거래소 이사장도 교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기대감도, 우려도 있다.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기조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완화냐, 강화냐'의 문제보다 문제가 아니다. 정책 기조가 바뀔 수는 있어도, 심사 기준은 일관돼야 한다. 한 IPO 업계 관계자는 "심사역들은 늘 보수적이고 꼼꼼한 편이지만, 실제 심사 결과는 윗선의 정책 방향에 따라 조율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엔 특히 위에서 높은 눈높이를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장 심사에는 일정한 구조와 원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윗선의 의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는 결국 시장 혼란으로 이어진다. 기업과 주관사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고, 혁신기업과 성장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받을 기회를 놓친다. 거래소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한 심사 시스템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기업이 적시에 상장하고,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 시점을 전환점으로 삼길 바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