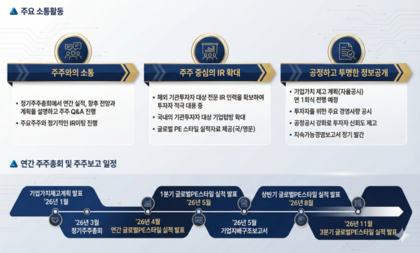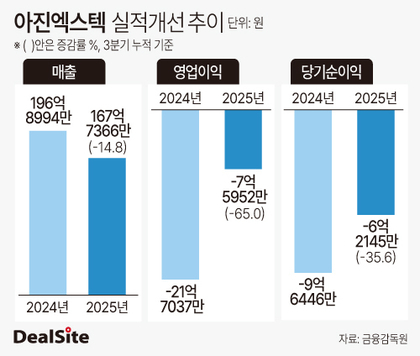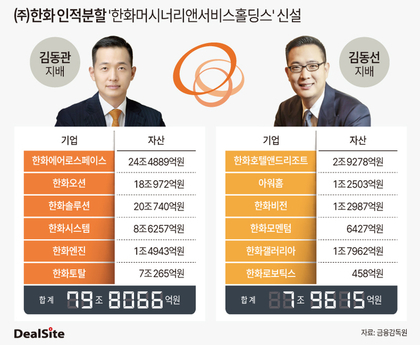[딜사이트 김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제도를 손보면서 벤처캐피탈(VC) 업계에 숨통이 트였다.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초기 운용 부담을 낮추고, 조합 GP의 개별 펀드 투자 의무를 없애 펀드별 특성에 맞는 운용 전략을 재설계하도록 했다. 민간 모펀드는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고 세액공제를 3%에서 5%로 높였다. 규제를 풀어 자율성을 넓히고 세제 인센티브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며 제도 기반을 손질해 돈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다.
벤처투자 '판'이 커진 것은 분명하나 족쇄가 느슨해질수록 성과의 책임은 더 선명해진다. 3년 안에 투자를 해야 해서 쫓기던 구조가 5년으로 늘었다면 이제는 할 수 있어서 투자하는 시장이 된다. 그때부터는 '딜이 없어서', '시장 탓이라서', '규제가 빡빡해서' 등 핑계가 사라진다. 투자금이 커진 만큼 좋은 딜의 기준은 높아지고 실패의 비용도 커진다.
민간 모펀드 500억원 시대가 열리면 중형사도 도전할 수 있다. 다만 모펀드는 이름부터가 관리의 산업이다. 자펀드를 어떻게 고르고, 리스크를 어떻게 나누고, 성과를 어떻게 검증해 자본을 재순환시키느냐가 핵심이다. 문턱이 낮아진 만큼 검증의 기준을 업계 스스로 더 엄격히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펀드는 민간 자본 유입의 통로가 아니라 느슨한 돈이 쌓이는 저수지가 된다.
VC에 필요한 건 체크리스트다. 속도 조절은 분할 집행을 설계하라는 의미이고 후속 라운드와 위기 국면을 버틸 실탄이 없으면 좋은 포트폴리오도 중간에서 꺾인다. 사후관리와 밸류업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 업무다. 회수 설계, 기업공개(IPO)만 바라보는 한 줄짜리 출구전략이 아니라 인수합병(M&A)·세컨더리·부분 회수 등 복수의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깔아야 한다.
규제 완화는 VC 업계에 기회를 주겠다는 말보다 이제 결과로 말해달라는 주문처럼 읽힌다. 정부가 판을 깔았으면 업계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 좋은 투자는 시장이 회복될 때가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드러난다. 올해의 규제 완화가 완화로만 기억될 지 성과의 전환점으로 남을지는 선택에 달렸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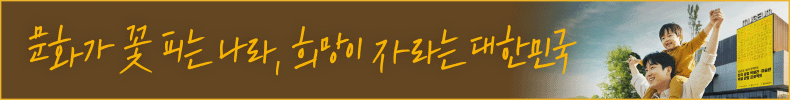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