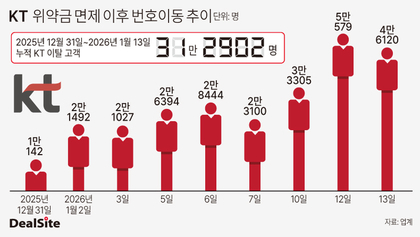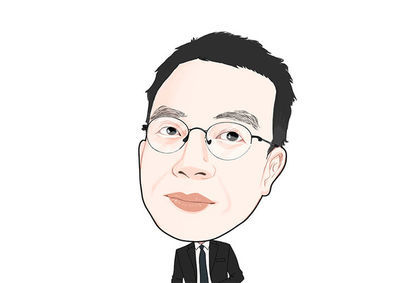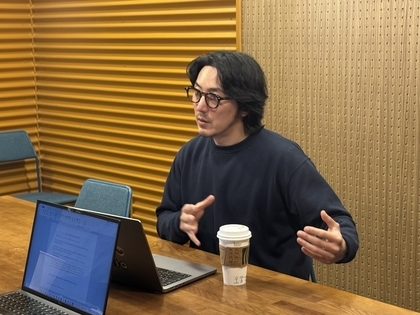[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질타했다. 건설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3% 과징금이나 1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법안도 뒤이어 발의됐다. 순식간에 건설사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주체'로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물론 기업이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현실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최근 7년간(2017~2023년) 산업재해 사망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본질적으로 건설 현장은 높은 작업환경, 무거운 장비, 돌발 변수 등 위험 요인이 겹겹이 쌓여 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가 공기와 비용을 줄이려다 사고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지만 실제로 건설사는 사고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고 브랜드 평판 하락과 사업 중단 등 치명적인 리스크까지 함께 떠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구조적 특성을 외면한 채 사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기업 탓으로만 돌리는 접근이 실효적인지도 의문이다. 원인을 단순화하면 대책은 좁아지고 현장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안전 강화라는 명분 아래 건설사가 각종 규제로 내몰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책임 공방과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안전 논의는 기업 차원의 관리·통제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때 안전 관리에서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이 있다. 바로 노동자 안전의식의 부재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최근 8년 치 건설사고 전수 조사에 따르면 사망사고 원인의 절반 가까이가 개인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보호구 미착용, 임의 작업, 위험 신호 무시 등 개인의 안전 행동과 관련된 사고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결국 시스템·규제·통제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논의는 문제의 절반만을 다루는 셈이며 그 결과는 반쪽짜리 안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건설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을 챙기기보다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을 위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 건설사의 안전 관리 강화로 이러한 인식을 더욱 고착시키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처벌이 강화된 이후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엄격해지자 일부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스로의 안전 의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통제만 강화되다 보니 자신을 '감시받는 대상'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 일용직 중심의 건설 환경에서는 안전교육이 번거로운 절차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 책임이 기업과 관리 주체에게만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자발적 안전의식이 자라기 어렵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고, 안전관리자는 이를 보조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 사망사고 만인율은 1.57‰로, 노동자의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일본(0.59‰)보다 크게 높았다. 일본의 낮은 사망만인율을 두고 일부 전문가는 장인정신을 중요한 배경으로 꼽는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건설노동자를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만연하다.
국내에서는 건설 노동을 숙련 기반의 전문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약한 편이다. '노가다'라는 낡은 인식은 외부의 평가뿐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직업적 자부심까지 약화시키며 이런 환경에서는 안전규범이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다. 노동자 역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 전문 직업인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사의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안전의 주체가 노동자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노동자이며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는 감각이 자리 잡아야 사고 예방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건설 노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바꾸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제도·규제·처벌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지점을 보완할 때 비로소 비극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