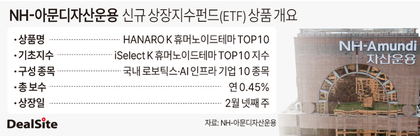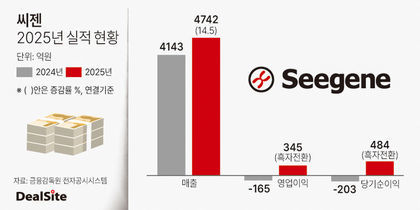[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레페리가 작년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업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며 날아올랐다. 특히 소속 크리에이터의 이탈이라는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고 뷰티테일 밸류체인을 구축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 해소한 모습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레페리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레페리의 작년 연결기준 매출은 47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1.0% 늘어난 61억원으로 집계됐고 당기순이익은 28억원으로 흑자전환(2023년 순손실 37억원)했다. 또한 이 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세전이익)은 37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레페리의 호실적은 국내 MCN업계가 봉착한 상황을 놓고 보면 의미가 남다르다. 대부분 MCN업체들이 수익모델의 한계에 부딪혀 흑자 경영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1세대 MCN인 트레져헌터와 샌드박스는 영업손실액이 각각 46억원과 47억원으로 집계됐고 레페리와 같은 뷰티 MCN인 디밀(디퍼런트밀리언즈)도 같은 기간 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사실 시장에서는 그동안 MCN의 수익모델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왔다. 이들의 사업은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광고 활동을 대행하거나 영상 편집 및 제작에 참여하는 등 연예기획사와 방송국의 중간 형태를 띈다. 다만 대부분의 수익이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MCN업계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이탈'이라는 잠재적 리스크에 발목을 잡혀왔다. 샌드박스의 경우 곽튜브·빠니보틀·슈카월드·침착맨 등 대형 크리에이터가 연이어 이탈하면서 크게 휘청였고 CJ ENM의 DIT TV도 소속 크리에이터가 2022년 1400여명에서 작년 600여명까지 줄었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레페리의 경우 소속 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통해 이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개성과 진로 방향성에 맞춰 크리에이터를 수십명 단위로 분류한 뒤 독립된 리더와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매니지먼트를 진행하는 사내독립기업(CIC) 체계다. 이에 더해 회사는 독자적인 육성시스템을 통해 현재 800여 명의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페리가 '뷰티테일 밸류체인'도 긍정적인 요소다. 현재 이 회사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존 MCN 역할에서 탈피해 뷰티 부문에서 '제조-마케팅-유통-수출'을 아우르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 레페리는 2018년부터 자체 뷰티 브랜드 '슈레피(Surepi)'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셀렉트스토어'를 통한 유통부문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
레페리의 IPO에 대한 시장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 회사는 작년 신한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심사청구, 내년 상반기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레페리가 장기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주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레져헌터와 샌드박스도 IPO에 도전했지만 결국 수익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결국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만약 레페리가 상장에 성공한다면 국내 MCN 1호 사례가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장 관계자는 "레페리는 MCN의 한계점인 소속 크리에이터의 이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자체적인 수익구조도 어느 정도 구축한 모습"이라며 "최근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K뷰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레페리 측은 "코스닥 상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뷰티 콘텐츠-마케팅-리테일 커머스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며 "국내외 유망 뷰티 브랜드들의 글로벌 성장 솔루션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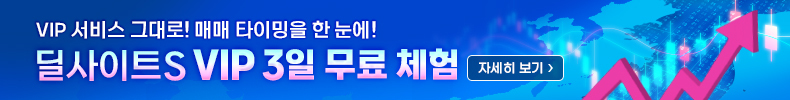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