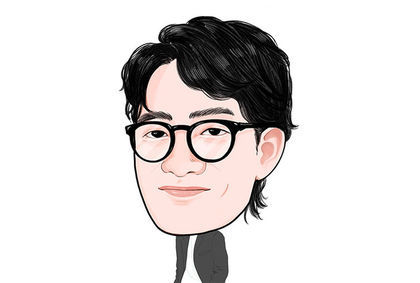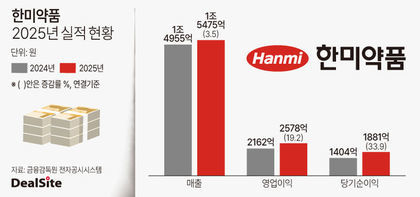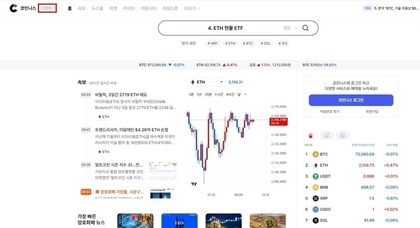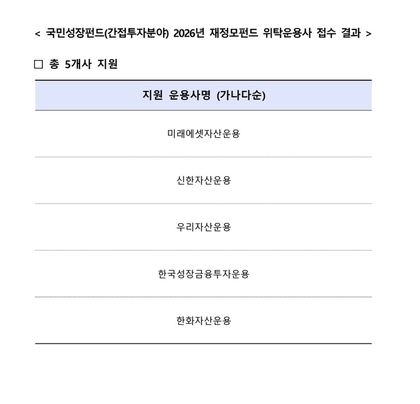[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토종 사모펀드(PEF) '맏형' 스틱인베스트먼트가 경영권을 매각했다. 스틱인베스트의 창업주 도용환 회장이 주인공이다. 지난달 도 회장은 본인의 스틱인베스트 지분 2%를 남긴 채 나머지를 미국계 PEF 미리캐피탈에 넘겼다. 대개 토종 PEF 창업주들이 함께 일하던 후배 파트너에게 지분을 물려주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승계 방식이다.
도 회장은 1세대 벤처캐피탈리스트로도 꼽힌다. 1996년 투자사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기 신한생명을 떠나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벤처캐피탈(VC)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에 가까웠다. 도 회장은 단순 대출을 넘어 미국식 벤처캐피털을 국내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로 업계에 들어섰다. 자금뿐 아니라 시스템과 전문성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지금의 VC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기업 구조조정 투자, 경영권 인수, 대체투자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PEF로 보폭을 확장했다. 지난 2021년에는 국내 PEF 최초로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다. 창업 이후 30여 년 만에 스틱인베스트는 운용자산 10조원을 굴리는 초대형 운용사로 성장했다.
다만 모든 회사가 그렇듯 스틱인베스트가 커질수록 도 회장의 경영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 특히 최근 들어 행동주의 펀드의 거센 압박을 받았다. 이들은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며 최대주주 중심의 소유 구조가 장기적으로 운용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계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공격의 소재가 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도 회장 이후의 스틱인베스트를 둘러싼 질문이 점점 커졌고 창업주 체제의 한계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도 회장은 버티기 대신 정공법을 택했다. 경영권을 붙잡기보다 스스로 출구를 설계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간 우호적으로 소통해온 미리캐피탈에 지분을 넘기며 지배구조를 바꿨고 동시에 행동주의 펀드의 명분도 약화시켰다.
일각에서는 이 결단을 두고 막다른 상황에서 선택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사주를 활용한 백기사 확보 등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와의 주총 표 대결이 임박하자 미리캐피탈을 사실상 유일한 해법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스틱인베스트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잠재적인 거버넌스 리스크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펀드 운용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1세대의 정리된 퇴장은 언제나 어렵다. 도 회장이 엑시트를 결심한 배경이 무엇이든 스틱인베스트는 창업 이후 처음으로 개인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도 회장은 한 발 물러났지만 회사는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창업주의 그늘이 아닌 조직과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운용사로 재편될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이번 선택이 스틱인베스트가 글로벌 운용사로 한 단계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