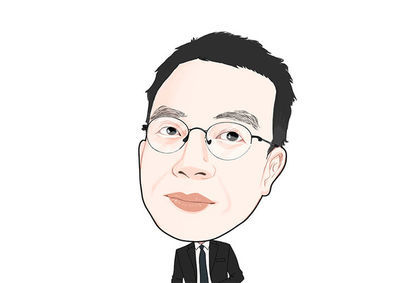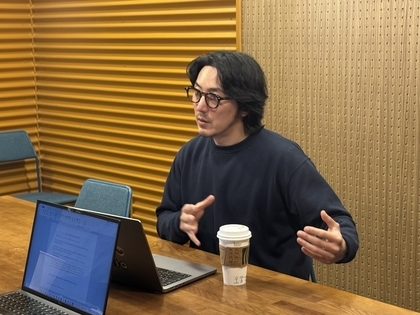[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기사에 대기업 실명을 언급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빼주세요."
얼마 전 한 코스닥 상장사의 IR 담당자는 자사와 관련된 기사가 나가자마자 이렇게 항의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업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과의 제품 공급계약 건을 새롭게 알게 됐다. 제품 출고 시 홍보성 자료도 배포한다는 얘기도 들었던 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해 이를 보도했는데, 기사에 특정 대기업의 이름이 들어가선 안 된다는 말이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과의 거래를 다루는 기사에서 대기업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게 '그쪽' 업계 불문율로 통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대신 'A사' 등 거래 상대방의 회사를 쉽게 유추하기 힘든 이니셜로 표현하든가 그게 어렵다면 관련 내용을 언급조차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만일 기사가 본인의 바람처럼 수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 건이 무산되는 등 자사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OOO, A사에 제품 공급한다' 등 주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거래 관련 기사 상당수에 거래 한 쪽 주체의 이름이 빠진 경우가 많다. 이 정도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듯싶다. 코스닥 상장사 특성상 대기업 하청 관계라 자사 기업 가치나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도 경쟁사와의 정보 누출 우려를 경계하는 대기업 입장을 더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도 이해 할 만하다.
하지만 이들 내용에 생소한 독자나 투자자는 어느 대기업과 계약했는지 알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다. 관련 기사에 '그래서 A사가 어디인가요'라는 댓글이 달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동종 업계에 종사자에게서 같은 질문을 받는 일도 종종 있다. 거래 쌍방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다보니 '거짓 소문'을 조성한다는 의심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지적도 나온다.
단순 거래조차 대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기사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코스닥 기업은 공급계약 금액이 전년도 매출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사실을 공시한다. 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 독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취재한 기사를 접하지 않고서는 더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렵다. 대기업에서 애당초 관련 계약에 대해 입단속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이번에 항의 전화를 받은 기업의 업종은 업황 둔화를 겪는 곳이다. 기술 경쟁력도 갖춰 과거 다수의 대기업과 수주 계약을 체결한 이력도 있다. 하지만 시장 불화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주가는 크게 하락한 상태다.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과의 거래는 분위기를 바꿔 볼 기회이지만 불문율이라는 관행 탓에 이를 알릴 길이 막혀 있다. "눈치 없이 홍보하고 싶다"는 코스닥 IR 담당자의 넋두리가 통할 날이 오길 기대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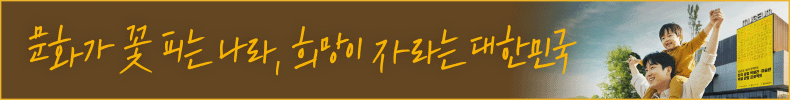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