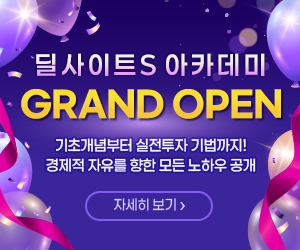[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나비의 날갯짓 같은 사소한 사건이 예상치 못한 큰 사태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건설업계에서 '나비효과'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68년만에 주인이 바뀐 한양증권이 있다. 한양학원 재단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결국 한양증권 매각으로 이어졌으니 말이다.
한양산업개발은 지난해에 496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초 한양산업개발의 자본총계는 291억원이었는데, 순손실 규모를 고려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다는 계산이다.
한양산업개발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부실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수금 영향으로 파악된다. 자금흐름이 막히게 되자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다 쓴 탓에 부채가 늘었고 차입금 부담이 커졌다. 고금리 및 고물가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상황은 악화됐다.
한양산업개발의 대주주인 한양학원은 계열사인 에이치디비씨를 동원해 한양산업개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에이치디비씨가 한양산업개발에 빌려준 자금을 출자전환해 자본여력을 키워줬다. 덕분에 한양산업개발은 지난해 완전자본잠식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양산업개발의 부실은 구원투수로 동원된 에이치디비씨의 재무건전성을 수렁에 빠뜨렸다. 결국 한양학원은 사태수습을 위해 우량 계열사인 한양증권 매각카드를 꺼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매출 3000억원, 자본총계 200억원대에 불과한 한양산업개발이 매출 1조, 자본규모 5000억원인 한양증권 매각의 원인이 됐다. 한양산업개발의 날갯짓이 폭풍을 만들어 한양증권 매각의 불씨를 제공한 셈이다.
수십 곳의 사업장 중에 한 곳의 부실 사업장이 건설사 도산의 원인이 되는 상황 역시 '나비효과'의 대표적 사례다.
건설업계를 넘어 금융권까지 파장을 미쳤던 지난해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역시 성수동 오피스 개발사업이 불씨를 당겼다고 한다. 태영건설이 성수동 오피스 부지매입을 위해 차입한 48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태영건설의 60여곳 사업장 모두 연쇄적으로 부실위기에 빠졌다. 결국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이르게 됐다. 이는 건설업계는 물론, 부동산PF 부실과 엮이며 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두산건설 역시 '일산 위브더제니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채권단 관리, 상장폐지, 지배구조 개편 등을 겪어야 했다.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빼돌리고 결국 도산하면서 시공을 맡았던 두산건설은 공사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1000억원이 훌쩍 넘는 손해를 봤다. 두산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였던 두산중공업이 자금을 투입했었는데, 이는 향후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두산건설은 주인이 바뀌게 됐다.
중견건설사인 동양건설산업도 서초 헌인마을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법정관리에 들어갔었다. 동양건설산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를 최고급 빌라촌으로 탈바꿈시키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2011년 해당 사업장의 PF 만기연장이 불발되면서 시공사가 4500억원 규모 대출을 모두 떠안았고 기업 회생절차를 통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당시 동양건설산업은 경기 사이클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영업이익 흑자행진을 이어가던 건실한 중견건설사였다. 하지만 1건의 PF부실이 결국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작은 부실 혹은 리스크가 결국 감당하지 못할 큰 폭풍을 만들어내는 나비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결국 회사가 위험에 빠지는 역사의 반복은 멈춰야하지 않을까. 건설업계에서 시작된 폭풍은 다른 계열사로, 다른 산업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사소한 리스크도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생존의 열쇠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