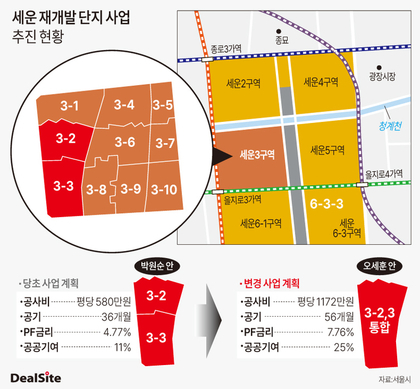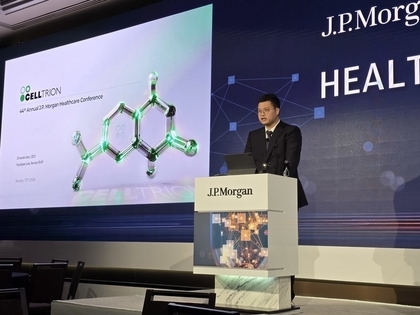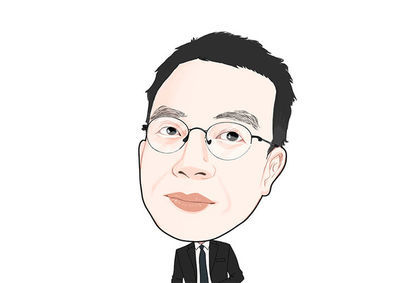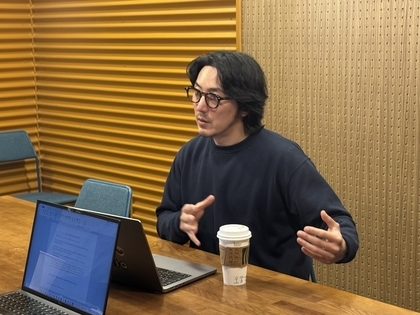[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감독 권한의 파이를 넓혀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감사직 등 유관 기관 자리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전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디지털자산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수개월째 이어지는 논쟁은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라기보다 권한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가깝다"며 "기술적 요건이나 소비자 보호 장치보다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회 제출을 공언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한은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해를 넘겨 표류하고 있다. 정책 당국 내부의 조율 실패가 반복되면서 제도화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그 사이 시장은 또 한 번 시간을 잃었다.
논쟁의 중심에는 한은이 강하게 주장해 온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이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과반 지분을 확보한 컨소시엄에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금융위는 기술기업과 비은행 금융회사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해야 혁신과 경쟁이 촉진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은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화 신뢰를 이유로 은행 중심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쟁이 시장의 시각과 얼마나 호흡하고 있느냐다. 업계에서는 한은의 문제 제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위와의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명까지 따라붙고 있다는 점은, 그 주장들이 시장의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읽힐 수 있는 명분이 시장을 멈춰 세우는 족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흐름에서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속도는 더욱 더디다. 미국은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통과시키며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제도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한국만 내부 조율에 발목이 잡힌 채 출발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경쟁력 측면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카드사, 캐피탈, 핀테크, 결제사 등 복합적인 밸류체인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모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려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순간, 위험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 "완벽한 통제 구조를 설계할 시간이 아니라, 시행과 보완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구조와 속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다. 그 답을 미루는 사이 시장은 정책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또 한 번 골든타임을 잃게 될 수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