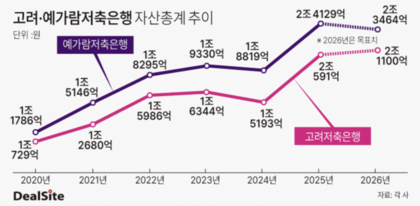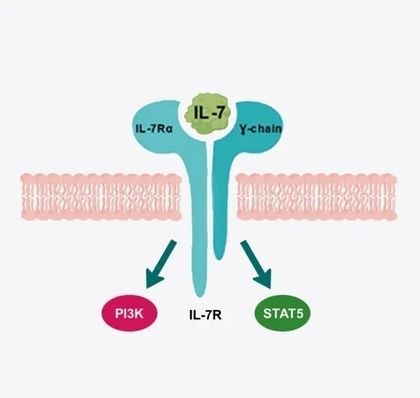[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작년부터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떠오른 게 '투자금 대비 분배 현금(DPI: Distribution to Paid in Capital)'이다. 말 그대로 PEF 운용사인 GP들이 출자자(LP)들에게 실제 수익을 얼마나 배분했는지 보여주는 이른바 회수율 지표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가 30억원을 회수해 LP들에게 배분했다면 DPI는 30%다.
LP들의 DPI 선호가 높아진 배경에는 전통적 평가지표인 내부수익률(IRR)의 왜곡 영향이 컸다. IRR은 현금흐름을 감안한 연평균 수익률로 회수하기까지 장부상 반영되는 수치다. 투자금회수(엑시트)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업가치(밸류에이션)에 따라 IRR은 높아질 수도 있다. 향후 회수 가능성은 불확실한데 IRR은 20~30% 수준으로 높은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셈이다.
최근 엑시트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기조도 DPI를 부각시켰다. 엔데믹 이후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회수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 이어졌다. LP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하기만 한 IRR보다는 현재 자신들에게 얼마가 분배됐고, 나머지 자산이 팔리면 추가 수익이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한 DPI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연스레 기관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운용사들도 DPI에 초점을 맞춰 펀드레이징과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 펀드를 조성한 지 몇 년이 채 안됐음에도 벌써 DPI가 20~30%에 달한다면 부각하거나 조기 엑시트를 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식이다.
우려스러운 건 회수율에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사모펀드의 정체성 자체가 흐릿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모펀드, 특히 바이아웃(경영권이전) 등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성과를 올리는 투자이기 때문이다. 빠른 회수에만 몰두할 경우 긴 호흡을 가지고 이뤄지는 투자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모펀드 시장이 일찍이 활성화된 미국 등에서도 과도한 DPI 집착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용사들이 LP 중간 배당을 위해 우량 포트폴리오를 매각해 배당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펀드 내 부실 자산만 남아 위험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된다.
반대로 GP가 LP 배당을 목적으로 피투자기업의 배당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과도한 리캡(자본재조정)을 단행하기도 한다. 이는 자칫 피투자기업의 재정상태를 망가트릴 가능성도 크다. 우량 포트폴리오 조기 매각이나 과도한 리캡 등은 최근 국내에서도 심심찮게 보이는 듯하다.
LP도 투자자인만큼 보다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지표를 선호하는 것도 이해할만 하다. 다만 국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현재는 일부 기관들만이 PE 출자가 가능하다. 이들의 행태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 지형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과거 한국이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상기하고 회수율과 수익성, 안정성 등 다양한 지표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