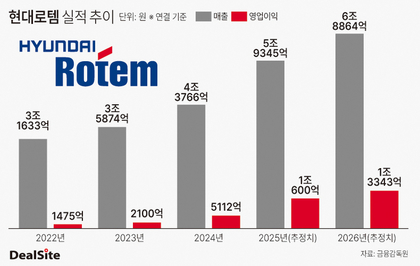[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현대건설이 이한우 대표 취임 이후 수익성 중심 경영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시공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지난해 말 빅배스를 단행하며 전년도 손실을 모두 털어낸 현대건설은 올해 이 대표 취임 이후 수익성 개선을 핵심 목표로 잡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무리한 확장 전략보다 신중한 수주전략을 펼쳤으며 일부 사업장은 시공권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의 수익성 관련 지표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3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428억원으로 전년 동기 102억원 대비 4배 가량 늘었다.
이는 원가율을 통제하며 매출총이익을 이전 대비 크게 끌어올린 결과다. 올해 3분기 현대건설의 원가율을 살펴보면 95.9%로 전년 동기 96.8% 대비 0.9%포인트(p) 줄어들었다. 급격한 감소는 아니지만 원가율을 통제했기 때문에 매출총이익은 1784억원으로 전년동기 1328억원 대비 34% 늘어났다. 매출총이익이 늘어난 만큼 고스란히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방어적인 수주 전략으로 인해 올해 누적 3분기 동안 건축·주택 부문 매출은 8조3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외형 축소를 감수한 대신 원가율 개선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는 성공했다.
이 같은 기조는 올해 들어 시공권 포기 사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올 초 을지로3가 을지파이낸스센터(EFC) 사업은 현대건설은 초기 공사자금을 투입하며 사실상 시공을 전제로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공사비 산정과 사업 기간을 둘러싼 부담이 커지자 협상을 끌기보다 시공권 포기를 결정했다. 현재 시공은 GS건설과 자이에스앤디가 맡기로 했다.
재개발 시장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도심 핵심 입지로 꼽히는 돈의문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현대건설은 공사비와 사업 조건을 놓고 시행사 측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협상 장기화 대신 접는 쪽을 택했다. 최종 시공권은 HL디앤아이한라가 가져갔다.
마포로5구역 10·11지구 역시 입지와 사업 규모만 놓고 보면 현대건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수익성과 리스크 요인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시공권 확보에 집착하지 않았고,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아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하는 방향으로 현대건설 내부 기준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한우 대표 체제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감지됐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수서역세권 B1-4블록 복합개발 사업에서 브릿지론 단계까지 관여하며 시공 후보로 거론됐지만, 본PF 전환 과정에서 공사비·사업성 조율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시공권을 포기했다. 최종 시공은 KCC건설이 맡게 됐다.
서울 은평뉴타운 시니어타운 개발, 강서구 등촌동 청년안심주택 등에서도 지분투자와 신용보강은 유지하되, 본격적인 시공에 따른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당시에는 개별 프로젝트 차원의 결정으로 비쳤지만, 올해 잇따른 시공권 포기 사례와 맞물리며 이 대표 취임 이후 회사의 수주 기준선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략 변화의 배경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관리와 원가 구조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최근 금리인하 움직임이 둔화되며 분양시장의 회복도 먹구름이 끼자 대규모 우발채무와 공사비 리스크를 떠안은 채 외형만 키우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최근 시공권을 포기한 사업장은 입지와 상징성만 놓고 보면 예전 같았으면 쉽게 놓치지 않았을 곳들"이라며 "이한우 대표 취임 전후로 회사 전반의 의사결정 기준이 매출·점유율보다 사업수지와 리스크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뀐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