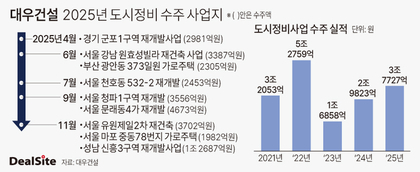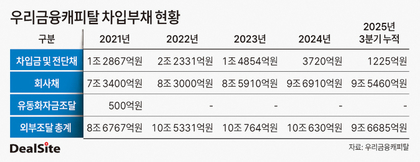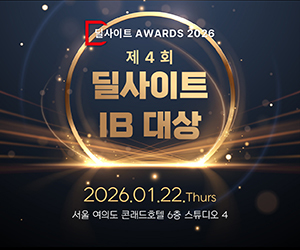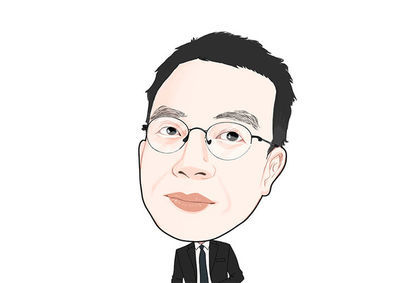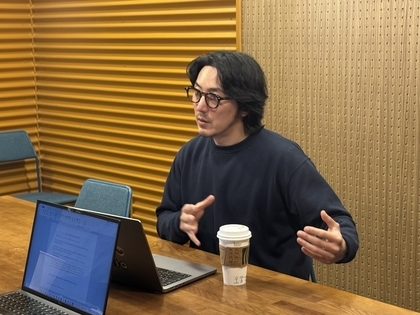[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GS그룹 핵심 계열사인 GS칼텍스는 정유업 부진 속에 부침을 겪고 있다. 오너 4세 허세홍 사장도 실적 변동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2년 최대 외형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뒤 실적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느 정유사들처럼 국제 정세 영향을 받는 유가와 정제마진으로 실적 변동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S칼텍스는 일산 80만배럴의 정제능력을 보유한 국내 2위 정유업체다. 과점인 정유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간 지주사인 GS에너지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쉐브론(Chevron)이 나머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회사의 수장은 1969년생으로 GS그룹 오너 4세인 허 사장이다. 2019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허 사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를 이끌며 차기 오너십 경쟁에서 선두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적 부침 속에 성과 또한 퇴색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유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국제유가, 정제마진, 글로벌 수급이 꼽힌다. 정유사는 유가가 급락하면 보유하고 있던 원유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때문에 영업이익이 쪼그라든다. 반대로 유가가 큰 하락 없이 일정하게 유지돼도 수익성은 나빠질 수 있다. 글로벌 수급 불균형으로 정제마진이 떨어지면 정유사 매출은 늘어나도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정제마진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 수송·운영비 등의 비용을 뺀 수치다.
올해 정유사들은 국제유가보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탓에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GS칼텍스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전년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성장한데 이어 올해 1분기 출발도 좋지 못했다. GS칼텍스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조1140억원, 116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11조8570억원)와 유사하지만 영업이익이 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 감산 완화 등으로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이 약세 흐름을 탄 영향이다.
취임 후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9192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해를 제외하면 허 사장의 GS칼텍스는 2022년까지 승승장구했다. 2022년에는 역대 처음으로 매출 50조원을 돌파한 58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정유 4사 가운데 최대 매출이었다. 그해 영업이익의 경우 4조원에 육박하는 3조9795억원을 기록했다. 이듬해 3월 배당금으로만 1조원 이상 지급했을 만큼 호황이었다.
허 사장이 전무,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2010년대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됐다. GS칼텍스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이었던 2011년~2014년 매출 40조원대를 유지했지만 2015년부터 저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매출은 20조원~30조원대로 떨어졌다. 2010년대 정유업 최대 호황기로 꼽히는 2016년, 2017년에는 2년 연속 영업이익 2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장기 실적 추이를 고려하면 정유 4사가 과점하고 있는 정유시장에서 허 사장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시각도 있다. 실적이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이라는 핵심 요인에 좌우되면서 사업 확장, 수익성 등의 경영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분석이다. 허 사장이 GS그룹의 차기 총수 후보군에 속해있음에도 과점 구조의 정유시장에서 경영능력을 제대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허 사장이 GS칼텍스 경영 전면에 나선지 7년이지만 기업의 본원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다. 특히 정유 부문 의존도 80%로 여전히 높은 반면 신성장 동력은 뚜렷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정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까지 부진한 상황으로 업계 전반이 실적 어려움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정유업 신증설 부담이 적고 석유제품의 꾸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이 정유부문의 실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실적 개선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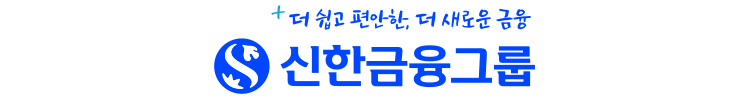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