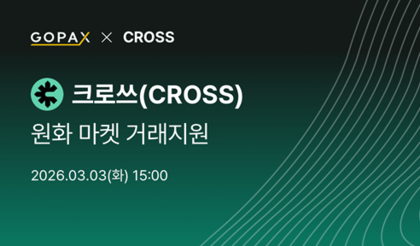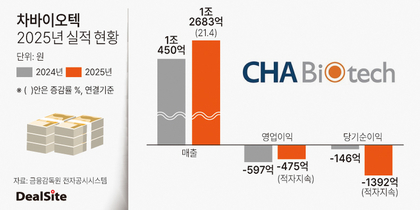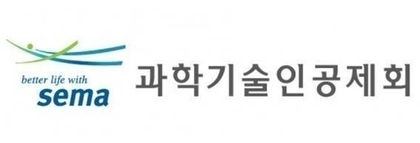[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제노스코'가 연구시설 확충 등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최대주주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대주주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코텍'의 영업 실적과 재무 상태가 제노스코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인 탓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제고를 계속하기 위해 오스코텍 소액주주의 반대에도 제노스코를 상장해 투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제노스코는 증시 상장을 통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목표다. 자세한 사용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보스턴 본사의 운영자금과 연구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제노스코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 받은 신약 '렉라자'의 원개발사다. 오스코텍이 2000년 미국 보스턴에 지분 100%를 출자하며 설립한 자회사다. 설립 당시 사명은 'OCT USA'으로 2009년부터 현재 사명을 사용했다. 2015년 렉라자 개발을 마치고 유한양행으로 관련 기술을 이전했으며 이번 FDA 승인으로 오스코텍과 함께 올해 렉라자 판매 로열티의 40%를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도 제노스코가 상장을 추진하는 건 최대 1000억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신약 개발과 관련해 대규모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다 렉라자 판매 로열티 등 관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최대주주인 오스코텍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오스코텍 역시 올해부터 제노스코와 동일하게 렉라자 관련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해 자금 지원이 제한적인 탓이다.
오스코텍의 지난해 매출액은 340억원으로 전년(50억원) 대비 586.8% 증가했다. 유한양행에 렉라자 기술이전으로 275억원의 수익을 얻은 덕분이다. 하지만 영업손실은 2023년 327억원, 지난해 27억원 수주이다.
오스코텍의 재무건전성도 1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제노스코에 지원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오스코텍의 자산총계는 1707억원으로, 자본과 부채는 각각 1324억원, 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계산하면 제노스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오스코텍 자본총계의 75.5%를 투입해야 한다.
외부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다. 국내 바이오시장 위축으로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제노스코가 기술성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지만 최근 바이오시장 침체로 추가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노스코의 상장이 물적분할 후 곧장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쪼개기 중복 상장'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태생부터 신설법인이었던 제노스코의 상장은 과거 국내 일부 기업이 자행하던 주주가치 훼손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오스코텍의 자금 조달 역량이 열위한 상황에서 제노스코의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장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제노스코는 현재 미래에셋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정하고 한국거래소에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미 렉라자의 FDA 승인으로 기술성을 입증한 데다 기술성평가에서도 각각 AA, AA 등급을 받았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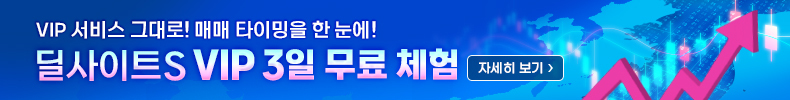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