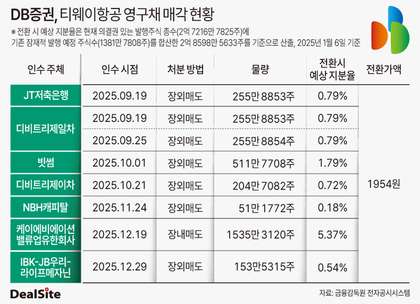[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한 한 기업이 상장한 지 1년도 안 돼 유상증자에서 나서자 뭇매를 맞고 있다. 유증 방식이 주주배정인 탓에 주주들은 기술력을 믿고 투자했더니 1년도 안 돼 다시 주머니를 털겠다는 셈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한 기업이 유상증자에 나서는 모습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올 하반기 확인된 기술특례 상장사만 최소 6곳이다. 이들은 기술특례 상장의 '골든타임'이 끝나갈 무렵 부랴부랴 유증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좀비기업이 연명을 하게 된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기술특례 상장사는 3~5년간 관리종목 지정에서 유예하는데, 이러한 골든타임이 끝날 때쯤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벗어나기 위해 유증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술특례 상장사는 매출 30억원 미만(5년),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의 자기자본 50% 초과(3년)를 각각 유예해준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다소 재무 요건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관련 보고서(특례상장 기업의 성과 분석과 시사점, 2022, 이석훈)에 따르면 특례상장 제도는 기술성장 기업에게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차별화된 상장 요건을 통해서도 상장할만한 기업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기술특례 상장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상장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상장 당시 제시했던 실적과는 큰 괴리율을 보이는 기업이 상당 수라는 점이다. 제시한 실적치를 달성하는 기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실적 부진은 재무 악화로 이어지고 부실한 곳간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며 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최근 상장 심사를 까다롭게 보고 있는 금융당국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IPO 주관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선 것도 고무적이다. 상장주관사 등이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상장 자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례상장 기업들의 주가 성과는 상장 직후보다 상장 4~5년차에서 크게 좋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기술특례 상장 특성상 그만큼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이 유증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거의 없다는 점은 문제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주주들에게 다시 투자를 요청하는 절차인 만큼 상식적으로 이에 대한 상황 설명과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흔한 보도자료 배포나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하는 방식 등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친소 관계에 있는 특정 매체와 일방통행식 인터뷰를 하는 행태도 보인다. 투자는 결국 개인 몫이니 회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이자 상장 회사로써 무책임한 행태다.
특히 '특례'를 받아 상장한 기업들은 기업설명회(IR)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게 기술력을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들에 대한 기본 태도다. 주주들의 주머니를 상대로 각출을 요구하는데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의 전향적인 '애디튜드' 변화를 기대해본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