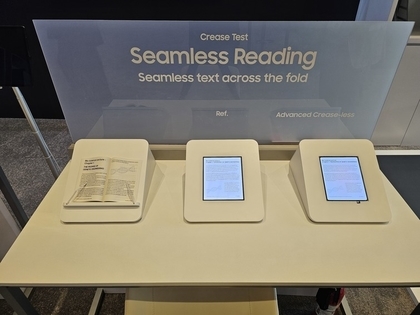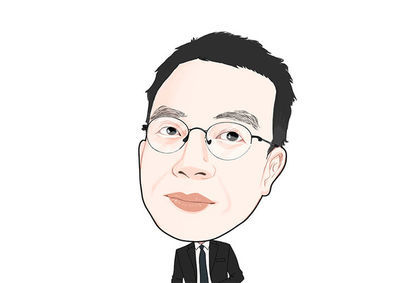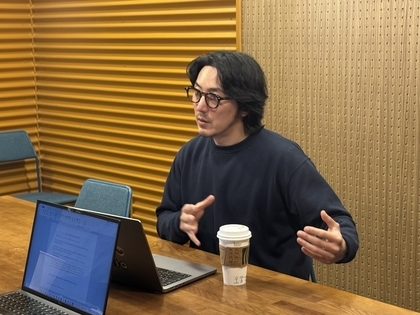[딜사이트 최령 기자] 선급금(업프론트) 규모가 기술 성공 가능성의 잣대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이센스 인(기술도입)을 추진하는 빅파마들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 업프론트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다. 같은 차원에서 임상시험 초기단계가 아닌 후기단계에서의 기술도입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텍이 임상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6일 법무법인 디엘지는 서울시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DLG 바이오 세미나: 2024년 회고와 2025년 전망'을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프론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의 추세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점점 더 라이센싱 딜이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업프론트는 기업의 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그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근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JP모건에 따르면 2019년 13%에 달했던 업프론트의 비율은 점차 줄어 올해 3분기 5%에 그쳤다.
업프론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건 실제 국내기업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빅파마로의 기술이전에 성공한 기업들은 ▲알테오젠 ▲에이프릴바이오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지놈앤컴퍼니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등이다. 다만 이 중 선급금 비율 5%를 넘긴 건 알테오젠이 유일하다.
조 변호사는 업프론트의 규모보다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은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알테오젠은 올 11월 일본 다이이찌산쿄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LT-B4'에 대한 독점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별 제품 개발과 허가·판매 등 마일스톤 달성 때 최대 수령 가능한 기술료는 총 2억8000만 달러(약 4000억원)이며 그 중 업프론트는 2000만 달러(약 280억원)에 달한다.
반면 올해 6월 에보뮨(Evommune, Inc)과 자가염증질환 치료제 'APB-R3'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에이프릴바이오의 경우 전체 계약 규모 대비 업프론트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해당 계약 규모는 총 4억7500만 달러(약 6550억원)로 그 중 업프론트는 1500만 달러(약 207억원)이고 나머지는 상업화 단계에 따른 단계적 기술료(마일스톤)이었다. 즉 상업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파이프라인을 기술이전하게 된 회사의 경우 전체 계약규모 대비 적은 돈을 손에 쥔 셈이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기술이전 임상 단계도 변화했다고 짚었다. 글로벌 빅파마의 임상 단계별 기술이전 규모는 2022년에는 1상이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3상 단계에서 이뤄진 기술이전이 1상과 2상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이제 1상 단계에 들어가면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1상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단계서 기술이전도 고려해야 할 때"라며 "아예 초창기인 디스커버리 단계 전에 라이센싱을 하거나 더 끌고 가서 2상·3상까지 가는 전략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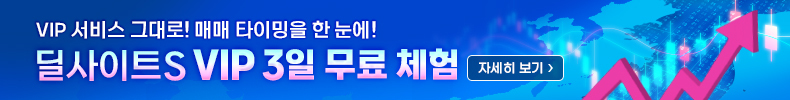
 Home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