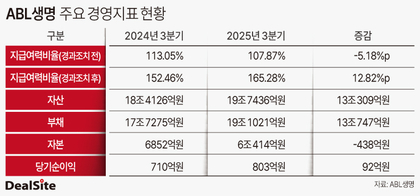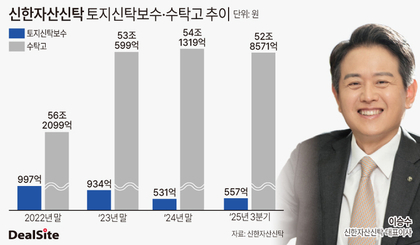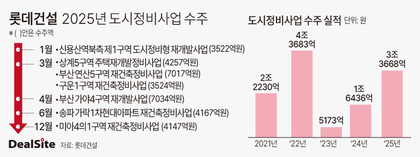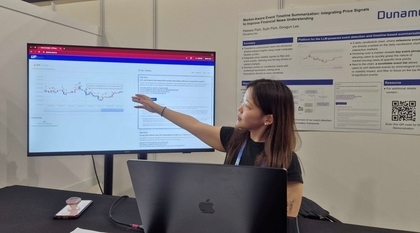한때 사양산업으로 불리던 제지업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재도약에 나서는 듯 했지만, 영업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원재료값과 전기료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약화하고 있어서다. 특히 대부분의 제지사가 단일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지업계가 일부 상위권사를 제외하고는 자수성가형 오너일가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춰 경영에 대한 견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딜사이트는 국내 상장 제지사들의 재무 현황과 지배구조, 추후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태림페이퍼의 자회사(100%)이자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전주원파워가 매출처 다각화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한 식구인 전주페이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스팀(Steam‧열)' 판매망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어서다. 태림페이퍼의 계륵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한 전주원파워가 자생력을 확보해 글로벌세아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주원파워는 주력제품인 스팀의 거래선을 다각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전주원파워의 전주공장이 위치해 있는 전주산업단지 내 중소제지사 등을 대상으로 스팀 판매를 협의하고 있다.
전주원파워는 폐목재‧폐가구 등 신재생 연료를 활용해 스팀 및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업체로, 올해 5월 골판지 원지 제조사인 전주페이퍼와 함께 태림페이퍼에 인수됐다. 중간에 SPC(특수목적법인)를 끼고 태림페이퍼(100%)→ 티앤제이인베스트먼트(100%)→ 전주페이퍼·전주원파워로 이어지는 구조다.
당시 태림페이퍼가 전주페이퍼와 전주원파워를 '통인수'한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평가가 적잖았다. 본래 태림페이퍼는 사업영역이 동일한 전주페이퍼만을 인수하기를 원했지만, 매도자인 모건스탠리PE의 협상력에 밀려 전주원파워까지 떠안았다는 뒷말이 오갔다.
전주페이퍼와 전주원파워를 동시에 엑시트 하고자 했던 모건스탠리PE가 통매각 입장을 고수했고, 태림페이퍼가 이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응했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해당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태림페이퍼 입장에서 전주페이퍼 몸값의 2배가 넘는 전주원파워까지 세트로 인수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며 "이에 전주페이퍼 만을 분리해 인수하고 싶다는 의견을 모건스탠리PE에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총 매매가 4950억원(부채 제외) 중에서 전주원파워가 3542억원을, 전주페이퍼가 1407억원을 차지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발전업과 제지업 간에 접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전주원파워 인수를 둘러싼 부정적 평가를 키웠다. 하지만 제지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견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은다. 스팀 등을 활용한 열관리는 제지 생산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반 종이의 경우 목재칩에서 추출된 슬러리(수분이 섞인 죽 상태의 펄프)를 스팀으로 건조시키는 과정이 수반된다. 주로 폐지(재생 펄프)를 활용하는 골판지 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전주페이퍼와 전주원파워의 생산시설이 인접해 있는 것도 이러한 프로세스와 연관이 있다. 두 기업의 생산 거점인 전주공장 주소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는 동일하다. 전주원파워 공장에서 생산된 스팀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전주페이퍼 공장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한 울타리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다만 전주원파워의 스팀 매출이 오로지 한 식구인 전주페이퍼와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주원파워 전체 매출의 50%를 담당하는 스팀은 오로지 전주페이퍼에만 공급된다. 내부거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데다가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거래선을 다각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주원파워는 인근 중소 제지사로 눈을 돌려 자사의 스팀을 공급할 신규 거래처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전주원파워 관계자는 "스팀 생산량에 여유가 있어 전주산업단지 안에 들어서 있는 제지사 등에 열공급 계약건을 협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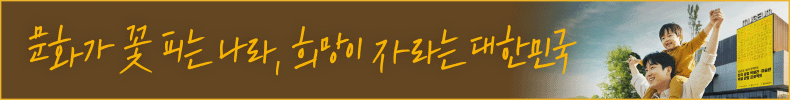
 Home
Home